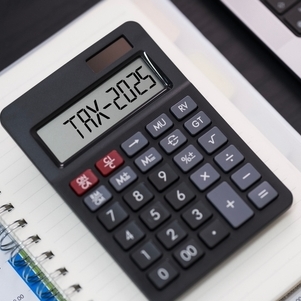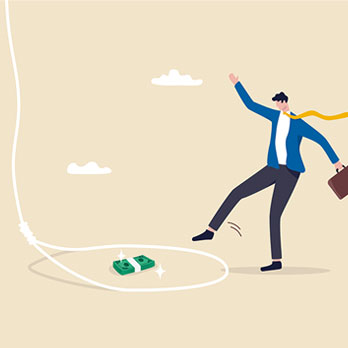10년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않은 착한 임대인의 역설
글 : 강성민 / 재정회계법인 회계사, 前 KBS 라디오PD 2025-04-28

필자는 1994년 KBS에 입사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때를 KBS의 화양연화(花樣年華) 시절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그 해 10월, 홍두표 사장이 제도 개선을 통해 한전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통합 징수함으로써 KBS 재정을 안정화시켰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로부터 사랑받는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입사한 직후 방영된 주말 드라마 라인업만 봐도 KBS 프로그램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역대 한국 드라마 시청률 1위 젊은이의 양지(1995, 65.8%)를 비롯해, 목욕탕집 남자들(1995~1996, 53.4%), 첫사랑(1996~1997, 62.7%)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한 때가 이 때였다.
1995년 3월, 종합유선방송(케이블채널)이 등장하면서 KBS, MBC, SBS 3사의 과점체제가 위협받는 듯도 했지만, 초창기에는 유료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한동안 공중파 TV의 위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중파 방송사 PD나 기자는 대학생들의 선망하는 직업군 중 하나였고, 그만큼 되기가 어려웠던 때라 ‘언론고시’라는 말이 일반화된 것도 그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더군다나 KBS는 공기업이기까지 했으니 많은 언론고시생들이 꿈꾸는 직장이었다.
KBS에 30년을 재직한 직원으로서 느낀 KBS의 장점은 크게 2가지였다. 일단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니까 일반 회사에 비해 일이 재미있었다.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만큼 지루할 틈없이 30년이 지나갔다. 그리고, 공기업이라서 대부분의 직원이 정년퇴직을 하는지라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었다. 최근에 다시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결국 오랫동안 유지되던 고용안정이라는 장점은 그대로 단점으로 다가왔다. 결국 정년퇴직을 할 것으로 생각했던 필자도 예상과는 다르게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두번째 직장에 적응해 잘 다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 오늘은 그에 대한 단상을 적어본다.

10년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않은 착한 임대인
KBS에 입사한 다음 해에 나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동네(대방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전세를 얻어 독립을 했다. 집주인이 3층에 거주하던 그 집 4층에서 나는 3년 정도를 살았는데, 임대인은 그동안 전세값을 올려 받지 않았다. 장기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없던 그 시절에도 그 집주인은 그야말로 “착한 임대인”이었다. 나는 잠깐 살다 나왔지만, 여기서 세를 오래 산 집도 있었다. 2층에 있는 한 집은 10년동안 살았는데 주인이 그동안 한번도 전세값을 올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10년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전세금을 안 올려줬으니 그 세입자는 돈을 많이 모았을까?
오히려 옆 건물에서 전세금을 매번 올려주어야 했던 세입자는 세를 올려줄 때는 힘들었지만, 결국 집을 사서 나갔는데, 10년동안 그대로 살던 그 집은 돈을 모으지도 못했고 집을 사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이 집을 팔게 됐다. 새로운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시세대로 올리겠다고 했고 2층의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게 됐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10년 사이에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그 보증금으로는 갈 수 있는 집은 없었다.

착한 임대인을 만난 것이 이 세입자에게 과연 행운이였을까?
물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알아서 저축을 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저항할 수 없는 압박이 있어야만 강제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필자는 KBS 같이 고용이 안정된 기업이 착한 임대인과 비슷하고, 거기에 다니는 직원은 일반적인 세입자라고 생각한다.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자기계발을 하기 때문에 회사를 나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긴다. 하지만, 정년퇴직이 보장된 사람들의 경우, 고용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 비해 퇴직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다. 평균수명이 길지 않았던 예전에는 퇴직 때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살면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착한 임대인이 나쁜 건 절대 아니다. 착한 임대인이 언제까지나 그 곳에 있을 것으로 낙관한 임차인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임차인이 거기에 사는 동안 착한 임대인의 잇점을 이용해 그동안 돈을 모아야 하듯이 고용이 안정된 직원들은 고용불안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회사에 있는 동안 자기계발을 통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주된 직장에서 얼마나 잘 나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상무나 전무, 본부장이나 사장을 했더라도 50~60대에 타의에 의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몇 살까지 얼마나 괜찮은 직업을 제2, 제3의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느냐가 삶에서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
린다 그래튼(Lynda Gratton, 1955~)은 『100세 인생』이라는 책에서 ‘교육-일-퇴직’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삶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일과 교육이 끊임없이 오버랩되어야 하는 무한 교육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강성민 재정회계법인 회계사, 前 KBS 라디오PD
2024년 초 30년 재직했던 KBS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대학에서는 화학을 전공했지만 어린 시절의 꿈을 찾아 대학원에서는 클래식을 공부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따 놓은 한 동안 장롱 면허 같았던 공인회계사 자격증으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은퇴와 연금에 관심이 많아 KBS 라디오 PD시절, 은퇴 팟캐스트를 제작했고, <연금 부자 습관>이란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의 노후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전파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 2막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