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AI로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비결은
글 : 한우덕 / 중앙일보 차이나랩 2025-04-18
중국 인공지능(AI)에 대해 얘기해보자.
쇼크였다. 딥시크(DeepSeek) 등장 이후 유튜브에는 중국 하이테크 얘기가 넘쳐난다. 어떤 이는 중국 IT 발전에 충격 받고, 또 어떤 이는 애써 찬양하기도 한다. 불과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 폭망'을 얘기하던 유튜버들은 빠르게 태세 전환을 했다.
'한심한 일이다.'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한 지인은 이렇게 한탄한다. 중국 AI 기술은 미국을 능가할 실력을 갖춘 지 오래전인데, 이제야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얘기다. 딥시크와 같은 기업은 각 분야에서 수없이 많이 숨어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왜 우리는 중국 성취에 놀라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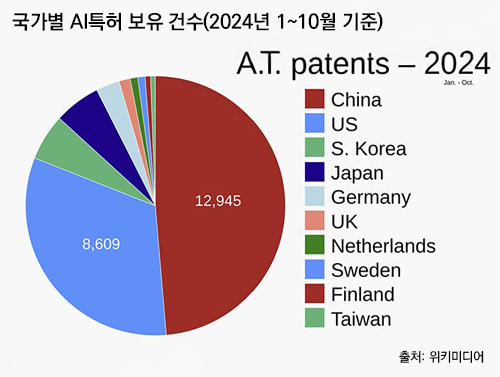
중국을 띄엄띄엄 보기 때문이다. 저류 트랜드를 읽지 않고 표면 현상만 보니, 작은 성과도 쇼크로 다가온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나라 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공직자라면 상시 감시하고, 관찰해야 할 대상이 중국이다. 중국은 언제든 우리 산업을, 내 회사를, 이웃을 옥죌 수 있는 존재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AI 실력, 어디까지 왔나
중국 AI 분야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자.
딥시크가 최신 모델 R1을 발표한 건 지난 1월 20일이었다. 그 ‘저비용 고효율’ 구조에 엔비디아 주가는 휘청했고, 과감한 소스 공개에 오픈AI는 체면을 구겼다. 중국 언론은 ‘중국이 해냈다’며 환호했다. 그 이후 딥시크는 중국 AI 기술을 상징하는 존재로 부각됐다. 창업자 량원펑(梁文鋒)에 세계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던져야 한다.
‘량원펑은 정말 하루아침에 미국을 놀라게 할 기술을 뚝딱 만들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혹 중국 AI 기술은 이미 발전 토대가 갖춰져 있는 건 아닐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중국 AI의 실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량원펑을 낳을 수 있는 토양이 갖춰졌다면 중국에서는 제2, 제3의 량원펑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블랙 리스트(수출 통제 기업 목록)’에 올린 중국 AI 회사(기관)는 2개다. 벤처기업 즈푸(智譜)AI, 그리고 비영리 조직인 ‘베이징 인공지능 아카데미(BAAI)’가 그들이다. 미국이 이들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두 곳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탕지에(唐杰·48) 칭화대 교수가 주인공이다.
탕지에가 칭화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건 2006년이었다. 대학 때부터 AI에 관심이 많았다. 졸업 바로 그해 그는 생성형 AI 기반의 학술 논문 검색 플랫폼인 ‘A마이너’를 개발했다(www.ç.cn). 공개 때 이미 전 세계 1억3600만 명의 학자 정보, 2억3000만 편의 논문 정보를 수록했다.
‘이게 중국에서 나왔다고?’
세계 과학기술계는 반신반의했다. 맞다. 탕지에 연구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생성형 모델은 그만큼 강력했다.
서른도 안 된 청년이 중국 최고 대학 교수로
A마이너는 쑥쑥 자랐다. 현재 수록된 논문만 약 3억3000만 편. 어려운 과학기술 논문도 5초면 쓱싹 요약해준다. 과학자들과의 대화 기능도 넣었다. 요즘 하루 약 3만 명이 방문해 논문 정보를 검색한다. 국내 학계 교수들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 논문 검색할 정도다.
졸업 때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다. 탕지에의 선택은 학교. 졸업 후 칭화대에 남은 그는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임용돼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당시 그의 나이 겨우 스물아홉. 중국 최고 대학이 서른도 안 된 ‘새파란 청년’을 교수로 임명했다. 우리라면 가능했을까?
탕 교수는 2019년 A마이너를 상업화한 한 벤처기업 즈푸AI를 설립했다. 지난 1월 ‘블랙 리스트’에 오른 바로 그 회사다. 그게 시작이었다. 탕 교수는 즈푸AI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AI 모델 고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탕지에 연구팀이 대형 언어 모델(LLM)인 ‘우다오(悟道)2.0’을 발표한 건 2021년 6월이다. 1조7500억 파라미터(매개변수)를 적용했다. 이는 당시 오픈AI의 챗GPT3.0보다 약 10배 많은 수준. 전문가들은 중국 AI 기술이 ‘우다오2.0’을 계기로 미국과 견줄 수준으로 도약하게 된다고 본다. 딥시크가 출범s할 기반 역시 그때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다오2.0’의 표면적인 개발 주체는 베이징 시정부 산하 비영리 조직인 BAAI였다. BAAI가 시정부·칭화대·즈푸AI 등을 연계해 개발하는 형식으로 발표됐다.
‘왜? 개발은 탕지에 교수가 했는데? 그걸 활용하면 떼돈 벌 텐데…?’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탕지에는 왜 ‘우다오2.0’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지 않았을까? 중국 특유의 ‘국가 주도의 산업 발전’ 전략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화웨이가 개발한 스마트 기기 운영체제(OS)인 ‘하모니OS’의 유통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운영체제(OS)는 속성상 바꾸기 어렵다. 수많은 응용프로그램이 이를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복잡한 연결망을 끊을 수 없으니 바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많은 기업이 도전했으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막혀 실패한 원인이다.
그러나 하머니OS는 달랐다. 이미 중국 전체 스마트 기기의 약 18%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하머니OS를 깐 단말기가 10억 개를 넘겼다. 공장·학교 등 18개 분야에서 2만 개 이상의 앱이 운용되고 있다(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하머니OS가 탄생한 건 2018년, 불과 7년 사이에 이뤄낸 성과다.
국가가 뒤에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조직인 ‘개방 원자 재단(Open Atom Foundation)’이 그 실체다. 화웨이는 하머니OS 소스를 모두 이 재단에 ‘헌납’한다. 재단은 산업별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율하고, 해당 소스를 업계에 공개한다. 원하는 기업 누구든 가져다 쓸 수 있다. 바이두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수퍼체인’, 텐센트의 저전력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타이니’ 등도 같은 방식으로 하머니OS를 쓰고 있다. ‘미국 OS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친 모습이다. 그렇게 중국 산업에서는 국가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 구분이 애매해진다.
마찬가지다. 탕지에의 즈푸AI는 ‘우다오2.0’을 사실상 BAAI에 헌납했다. BAAI는 ‘우다오’ 시리즈 등 AI 모델 소스를 오픈 플랫폼에 올려 공개하고 있다. 하머니OS에 개방 원자 재단이 있었다면, 우다오2.0에는 BAAI가 있었던 셈이다.
BAAI는 ‘국가 AI 생태계의 허브’다. AI관련 주요 소스를 업계 무료로 전파하고, 이를 통해 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인재를 발굴해 키우고, 국제 세미나를 조직하고, 정책 건의도 한다. 정부와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연결하는 국가 AI 생태계의 중심에 BAAI가 있었던 셈이다. 미국이 지난 25일 이 조직을 ‘블랙 리스트’에 올린 이유다.
BA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AI 생태계가 결국 딥시크와 같은 회사를 키웠다. 제2, 제3의 량원펑은 지금 어느 연구실에서 성장하고 있을 터다. 그 생태계에 ‘영혼’을 불어넣은 사람이 바로 탕지에다. 미국에 그는 ‘위험인물’일 수밖에 없다.
탕지에 교수와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국내파라는 점이다. 량원펑 역시 저장대 출신의 토종 전문가다. 그들은 유학 경험 없이도 미국에 견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중국 AI 업계에 이미 폭넓은 인재들이 축적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 AI는 그렇게 토착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한우덕 중앙일보 차이나랩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경제를 자유롭게 오가는 중국 경제 전문가. 1989년 한국외국어대학 중국어과를 졸업했다.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하여 국제부 · 정치부 · 정보통신부를 거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특파원으로 근무했다. 상하이 화둥사범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중앙일보 차이나랩 선임기자로 두 눈 부릅뜨고 한국이 중국과 함께 살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중국의 13억 경제학', '세계 경제의 슈퍼엔진 중국', '상하이 리포트', '뉴차이나, 그들의 속도로 가라', '경제특파원의 신중국견문록', '차이나 인사이트 2021'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뉴차이나 리더 후진타오' 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