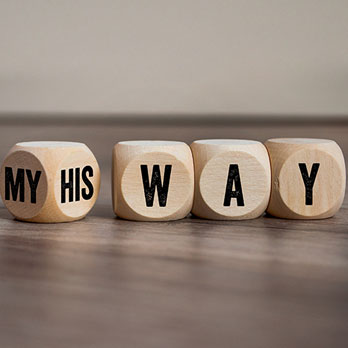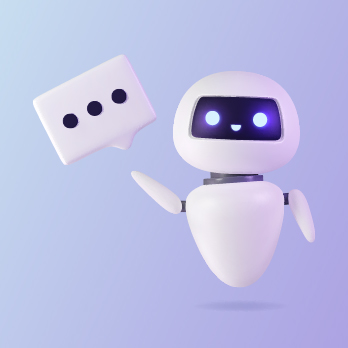실버타운에서 삶을 마무리한다면
글 : 이지희 /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2025-03-26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본인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는 종활(終活, 슈카츠)이 이슈가 되고 있다. 종활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으로 현재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종활 산업의 규모가 연간 5조 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웰다잉 혹은 죽음 준비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어보자. 엘리베이터의 4층은 숫자가 아닌 F층으로 표기한 곳이 많다. 죽을(死)와 숫자(4)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실버타운에서는 죽음에 대해 어르신들과 터놓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일까? 몇 년 전 납골당 관련 회사에서 실버타운에 납골당 소개 팸플릿을 비치할 수 없냐는 연락을 받았는데 한 시설 원장님께 말씀드리니 어르신들이 싫어해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반면 최근 일본의 시니어들은 종활의 일환으로 본인의 납골당을 미리 정해놓고 같은 납골당에 묻힐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교류를 한다. 일종의 무덤 친구끼리의 모임인 셈이다.
종활(終活, 슈카츠)의 의미는 무엇인가
종활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의 줄임말로 2010년 등장하였다. 결혼을 준비하는 활동인 혼활(婚活), 취업을 준비하는 활동인 취활(就活)이라는 단어에 이어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도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장례식을 미리 체험해 보는 상품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조문객이 없는 장례식 플랜, 최근에는 죽기 전 지인들을 불러서 미리 치르는 생전 장례식까지 시니어들은 본인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어디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로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정작 실버타운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다.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다가도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결국 요양원으로 옮겨가게 되거나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돌봄 수급 노인의 약 68%는 자택에서의 임종을 바라지만 실제로 70%가량이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재단 국제교류기금(The NIPPON Foundation)이 2021년 실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로 [자택]을 선택한 사람이 58.8%로 많았고, 병원 등의 의료시설을 선택한 사람은 33.9%, 유료노인홈이나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 등의 개호 시설을 선택한 사람은 4.1%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는 병원이 71.3%, 자택이 13.6%, 노인홈 등이 8.6%이었다. 한·일 모두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하길 원한다는 답이 가장 많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익숙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는 욕구가 아닐까?
장례식장을 갖추고 있는 일본의 유료노인홈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에 해당하는 일본의 유료노인홈 그리고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에서는 건강할 때 입주하여 돌아가실 때까지 케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실제로 미토리(看取り)라고 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설에서 미토리 개호를 하게 되면 미토리 개호 가산 제도를 통해 개호보험 수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작년 일본에서 역사가 매우 오래된 유유노사토(ゆうゆうの里)를 방문했을 때 놀랐던 점이 있다. 그곳은 건강할 때 입주하는 공간, 케어가 필요해졌을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각각 마련되어 있었고, 미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이미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었는데, 바로 시설 내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었다.
시설장님은 어르신들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간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시설의 직원, 그리고 어르신들과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이 원한다면 시설 내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생전 어르신과 친했던 입주자들과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조문하면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 어르신들이 충격받을 것을 염려하여 동료의 사망 소식을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이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실버타운에서 엔딩을 맞이하려면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실버타운에서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종말기 케어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 등이 없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도 않다. 인력과 설비 제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 차이도 크게 작용한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아직까지 실버타운에서 종활을 고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분들이 노화하면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아졌다. 너싱홈(전문요양시설)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한 층을 케어가 필요한 입주자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세팅하기도 한다.
시간이 더 흐른다면 종말기 케어와 웰다잉에 대한 고민을 실버타운에서도 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자신이 살아가던 공간에서 시간을 같이한 친밀한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고도 좋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남아 있는 사람도 떠난 사람을 가까이서 추억하면서 언젠가 나에게도 오게 될 마지막을 준비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한국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본처럼 가까운 장래에는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을 듯하다.
이지희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원에서 보건복지학 박사 취득 하였다. 현재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겸임교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국의 대표적인 시니어타운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의 사무국장직을 겸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