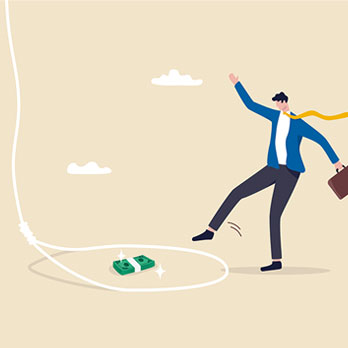정년연장 찬성 vs 반대, 당신의 선택은?
글 : 송양민 /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2023-04-25
우리는 흔히 회사에서 물러나는 정년(停年) 퇴직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는 은퇴(隱退)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은퇴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정년은 은퇴와 같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르다’가 정답이다. 정년을 맞았다고 하여 집에서 그냥 쉬기로 작정한다면 이는 아주 잘못된 마음가짐이다. 예전에는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인간수명(壽命) ‘100세 시대’에선 정년은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선일 수 있다.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해보자. ‘정년’은 일정한 나이가 되어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은퇴’는 돈을 벌 목적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노후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밥벌이를 위해 퇴직 후에도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예전의 직장에서 물러난 것은 맞지만,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직장을 구해 현역생활을 연장하는 것이다.
물론 젊었을 때부터 노후준비를 꾸준히 하여, 은퇴자금을 충분히 모아놓은 사람은 더 이상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퇴직과 동시에 은퇴생활을 시작하고,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자신의 꿈(사회봉사, 평생학습, 해외여행, 취미생활)을 실현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젊어서부터 은퇴준비를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정년은 현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오랫동안 기업들은 생산성(生産性)이 높고 임금이 싼 젊은 근로자를 고용하기위해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을 강제로 회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일방적 규정은 인권(人權) 침해로 인식되었고, 선진국들은 ‘연령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나이의 많음을 이유로 기업이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들에선 연금 수령(受領)을 시작하는 60세, 62세, 65세(국가별로 연령이 약간씩 다름) 근처에서,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나이가 곧 정년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말이다. 외국 영화를 보면,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밝은 웃음을 지으며 동료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축하의 박수 속에 사무실을 나가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산업화가 늦게 진행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정년을 명시한 법규가 없어 기업들이 마음대로 고령(高齡) 근로자들은 내보낼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 노동관련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2016년부터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로 정하는 법제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조항일 뿐, 정년 규정을 잘 지키는 기업들은 별로 많지 않다.
많은 기업들이 불황(不況)을 이유로 자주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을 53~55세 전후에 퇴직시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특히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함으로써 60세 정년규정을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만들고 있다. 또 정년 규정을 지키는 기업들도 대부분 정년 3~5년 전부터 임금 피크제(임금을 대폭 깎는 제도)를 실시하여 비슷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교육공무원은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건강한 고령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요즘의 현실을 반영하여, 고령자들이 현역생활을 좀 더 오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또 ‘연금개혁(pension reform)’이라는 또 다른 목적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자가 증가하는 나라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노인이 계속 증가하면, 2055년쯤 국민연금기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고갈(枯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고령자들이 65세까지 직장을 계속 다니도록 함으로써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또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도 늦추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면 민간기업들도 뒤따라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정년 연장 추진에 찬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기업들의 정년이 연장되면 노후준비가 부실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조금 더 생기게 될 것이다.

정년 연장에 호의적인 국내사정과 달리, 정년이 우리보다 긴 유럽 국가들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최근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년연장(62세→64세) 정책에 반대하여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노령연금 적자가 누적되어 프랑스 국가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는 게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이다. 후세대(後世代)의 연금부담(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연금 수령 나이를 64세로 꼭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 시민들은 정부의 정년 연장 결정에 대부분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태도에는 프랑스인의 3분법 사고방식이 짙게 깔려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는 시기가 있고(first age), 이후 30~40년간 직장생활을 하고(second age), 마지막으로 은퇴하여 인생을 즐기는 시기(third age)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을 해야 할 만큼 충분히 한 사람들은 빨리 퇴직하여 ‘즐거운 은퇴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프랑스인들은 생각한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은퇴생활을 버겁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은퇴자들과는 사뭇 딴판이다.
이런 차이점을 보면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잘 되어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에 접어든 프랑스는, 노인부양을 위해 매년 GDP의 14%에 달하는 막대한 연금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그 결과, 연금 기금은 오래 전에 바닥났고, 지금은 젊은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걷어(부과방식 연금제도) 노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와 비슷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년 연장은 언젠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우리나라에선 젊은이의 일자리를 일부 빼앗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하는 입법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야, 첨예하게 맞붙은 세대(世代)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송양민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 후, 83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경제부장과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벨기에 루뱅 대학교에서 유럽학 석사,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가천대학교로 옮겨 보건대학원장, 특수치료대학원장을 역임한 뒤 2024년 2월 퇴직했다. 관심 연구분야는 인구고령화, 보건정책, 경제교육 등이며, 보건ㆍ복지ㆍ노동ㆍ연금분야 연합학술단체인 사회보장학회 회장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기사는 돈이다』, 『30부터 준비하는 당당한 내 인생』, 『밥 돈 자유』, 『100세시대 은퇴대사전』, 『ESG 경영과 자본주의 혁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