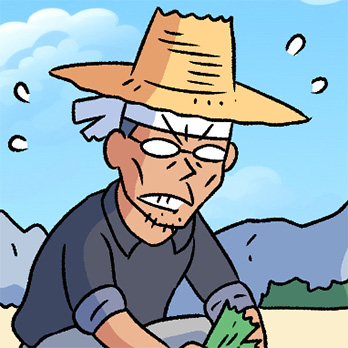와인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글 : 박찬일 / 로칸타 몽로 셰프 겸 음식 칼럼니스트 2023-10-23
와인에는 다양한 취향이 있다. 와인의 맛, 레드냐 화이트냐(스파클링과 포트는 빼더라도), 신대륙이냐 구대륙이냐, 무슨 음식에 뭘 마시는 게 좋냐, 가성비 10개만 골라보자 등의 관점은 전 세계가 비슷하게 등장한다. 한국과는 별로 인연이 없는 와인을 사들여 저장하는 방법을 토론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와인은 그 종류만큼이나 견해도 복잡하다. 그냥 쿨하게 “거, 마트에 1만원짜리 맛있던데”하는 분도 많지만, 타닌과 화합물, 빈티지, 숙성 등을 고민하는 분도 있다. 바로 이게 와인의 매력이기도 하다. 다 알자면 절대 불가능한 세계인데, 아는 만큼 재미있고, 또는 “어려운 얘기 말고, 그냥 즐기자!” 한다고 해도 무난한 동네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

와인을 알아가는 재미
와인을 팔고 마시는 식당가에서 일하면서 와인 책도 썼으니 내가 전문가라 생각하는 주변 친구들은 내 발언에 민감하다. 그저그런 부르고뉴를 마시는 자리에서 신맛밖에 안 나는 형편없는 부르고뉴에 관한 얘기를 꺼냈더니 부르고뉴 와인은 죄다 부정적인 와인으로 짐작하는 친구도 있다. 이미 판매하기에는 때를 놓친 화이트 와인에 미간을 찌푸렸더니 그 다음부터 화이트만 보면 예민해지는 친구도 있었다. “와인, 골치 아픈 거 딱 싫어서 그냥 마트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마신다”는 친구도 나는 인정한다. 심지어 그 시금털털한 걸 왜 비싸게 마시냐는 친구 말에도 동의해 준다.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와인은 어차피 좀 알수록 더 재미있다는 친구에게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물론 취미가 지나치면 차나 카메라처럼 돈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날려준다. 와인 책을 보겠다면, 서점에 가보라고 조언한다. 와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내게 맞는 텍스트를 만나기 어렵다. 특히 번역서는 여러 가지로 감각과 실정이 달라 꼭 손으로 펴보고 사는 걸 추천한다. 번역서의 경우 어울리는 음식 소개가 우리나라 상황과 달라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도 많다.
다만 번역서를 통해서는 와인을 보는 세계인의 시선을 단돈 몇 만 원에 체험해 볼 수 있다. 축구는 언어가 전혀 안 통해도 세계인이 즐길 수 있지만, 또 그 내부로 들어가면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축구 게임을 뛰는 것과, 축구를 둘러싼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건 다른 것이다. 물론 “공 차는 것이면 충분해”(맛있는 걸 마시면 그만이지) 하는 태도도 존중받아야 한다.
와인은 텍스트로 먼저 공부하라는 게 표준적인 조언이다. 한국 저자와 외국 저자의 것을 한 권씩 보라고 하는 고수가 많다. 가능하다면 와인 생산 지역의 지도가 상세한 걸 추천한다. 이러자면 서점에서 펼쳐보는 게 유리하다. 물론 그 시간도 없다면 인터넷으로도 맛보기 페이지와 목차가 나오므로 참고하면 좋다. 꼭 책이 아니어도 요즘은 유튜브로도 가능하다. 보조 자료로 보시는 걸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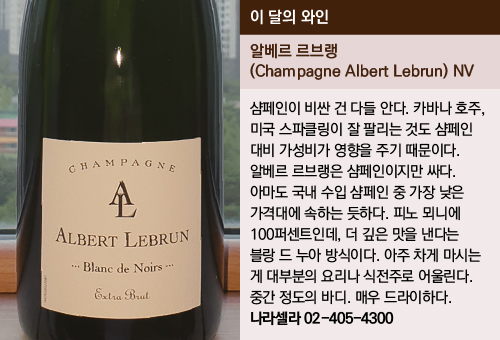
도움이 될 만한 와인 잡지
아주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외국 와인 저널을 보시라고 권한다. 영국의 “디캔터” 미국의 “와인 스펙테이터”가 인기 있다. 여담이지만 의외로 와인 종주국이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의 대중 와인 저널은 별로 재미없다. 언어적 문제도 있다.
나는 “디캔터”를 오래 봤다. 잡지답게 아기자기하고, 일반 소비자 취향을 잘 반영한다. 예를 들어 5파운드 미만(대략 1만원 미만)의 가성비 와인을 날카롭게 소개한다든지, 고급 애호가를 위한 주요 산지의 미출시 최근 빈티지 배럴 테이스팅(병입하기 전에 가치와 잠재력을 보기 위한 검사)을 싣기도 한다. 이런 평은 그 와인이 나중에 출시되었을 때 인기에 반영되고, 시판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한마디로 파워 있는 매체인 것이다. 예전엔 어려운 경로로 구입했는데 요샌 구매 대행 회사도 있고, 그냥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잡지명을 치면 1년 정기구독이나 낱권(과월호 포함) 구매가 가능하다. 현지 발매 가격에 비싼 국제발송료가 붙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신기한 일이다. 8월호 기준으로 2만3,750원. 배송료는 무료다. 현지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8월호 메인 특집은 세계 와인여행 50선이다. 구미가 당기지 않는가? 월간지인데, 꼭 매달 살 필요도 없다. 특집이 마음에 들거나 할 때 부정기적으로 보면 충분하다. 부수적으로 영어 공부도 되는 건 물론이다. 전문가 칼럼은 어렵지만.
와인 잡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유료 기사 서비스를 하기도 하며, 발매한 잡지의 목차 등을 볼 수도 있다. 독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서양 와인 애호가들의 고민과 취향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 요샌 번역기가 워낙 좋지만, 와인의 요란한 용어들로 인해 아직 의미 전달이 100% 정확하지는 않다.
박찬일 로칸타 몽로 셰프 겸 음식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