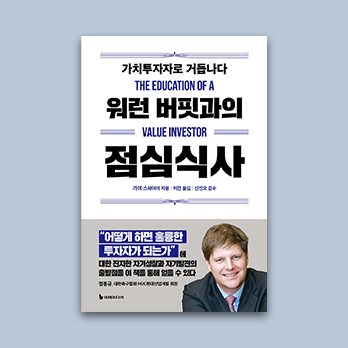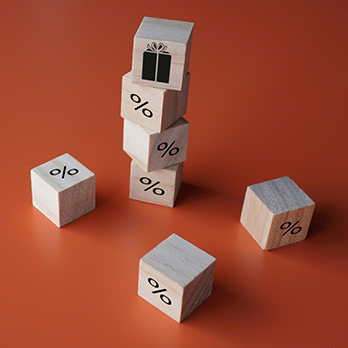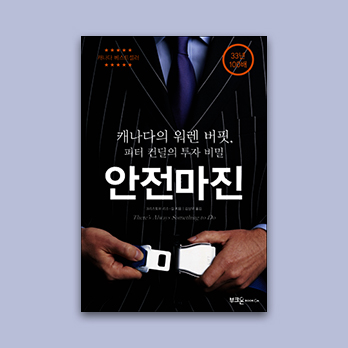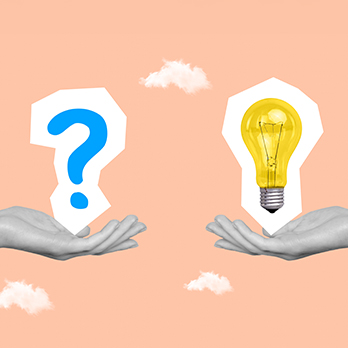소셜미디어에 흔들리는 주식시장에서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글 : 김준목 / 재무금융학 박사 2025-09-15
최근 X에서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소위 ‘밈(Meme) 주식’이다.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유행을 타는 종목이다. 대부분 기업 규모가 작고 실적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열풍이 불면 주가는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급등한다.

디지털 부동산 중개 기업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를 보자. 지난 6월 말 0.5달러였던 주가가 몇 주 만에 2.8달러까지 5배 넘게 뛰었다가 다시 2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실적은 그대로인데 급등한 이유는 단순했다. 온라인 입소문이었다.
소셜미디어 입김에 휘둘리는 주식시장
지난해 말 미국 퀀트 헤지펀드 AQR의 창립자 클리프 애스네스는 저널오브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JPM) 50주년 기념 글에서 “주식시장은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정보는 질과 상관없이 순식간에 퍼지고 사람들을 움직인다. 그러면 주가는 기업 현실과 괴리된 채 가격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마치 어제까지 3000원이던 바나나가 오늘 갑자기 만원이 된다면,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다른 과일 값은 믿어도 되는 걸까” 같은 의문이 생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애스네스는 “비전문 투자자라면 인덱싱(indexing)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인덱싱은 특정 시장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방식으로, 개별 종목을 고르지 않고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다.

500명의 유능한 CEO에게 내 자산을 맡기려면
대표적인 예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S&P 500 지수다. 이 지수의 장기 성과를 보면 왜 인덱싱이 주목받는지 알 수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3%, 50년 동안 11.6%, 100년 평균 10.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S&P 500 지수를 설명할 때 나는 이런 비유를 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최고경영자(CEO) 500명에게 자산을 나눠 맡기는 것과 같다고. 또한 이 지수는 시가총액에 따라 비중이 정해진다. 더 큰 기업일수록 더 유능한 CEO가 운영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더 유능한 경영자에게 더 많은 투자금을 맡기는 셈이 된다. 이 구조는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의 효과를 주며, 기술 발전으로 운용 비용도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런 지수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지는 20년도 채 되지 않는다. 개인이 수백 개 기업의 비중을 조절하며 투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접근성이 높은 수단이 마련됐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다. ‘밈 주식’은 투자가 아니다. 대중의 귀에 들릴 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는 게임에서만 승산이 있듯, 모르는 게임에는 애초에 참여하지 않는 편이 더 현명하다.

김준목 재무금융학 박사
연세대에서 산업공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재무금융학 석사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올린 경영대학원에서 재무금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MIT 골룹 재무정책연구센터(GCFP)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일하며 미국 공적연금제도 개선 방안 및 주택 연금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행동경제학, 기업지배구조, ESG 등을 연구하며 조선일보에 ‘팝콘 경제학’을 연재하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고객자산배분본부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을 분석하며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