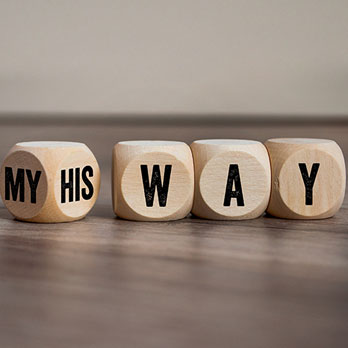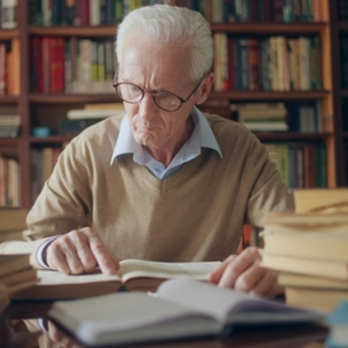70, 80이 넘어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 동력은 뭘까?
글 : 한혜경 / 작가, 前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11-28

*출처: 네이버 영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 영화는 이자크 디너센(Isak Dinesen)이라는 작가가 발표했던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바베트라는 천재 요리사의 만찬이 가져다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덴마크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두 자매에게 오갈 데 없는 프랑스 여인 바베트가 찾아오고 두 자매의 집안일을 돕게 된다. 어느 날 바베트는 만 프랑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되고, 그 돈으로 자매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100번째 생일 만찬을 차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좀처럼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고급스럽고 황홀한 요리를 만들어낸다.
이 만찬에 초대받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음식이란 그저 삶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하지만 바베트가 차린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먹기만 하던 사람들은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면서 영혼이 순수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말조차 하지 않던 노인들이 말을 하고, 서로를 욕하며 싸움을 일삼던 마을 사람들의 사이가 좋아진다. 사람들은 먹고 마실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과 온기가 퍼져나가는 걸 느끼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그동안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축복하면서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간다. 마을에 감돌던 불화, 각자 느끼던 고립감도 사라진다.

*출처: 네이버영화
이 영화는 음식이 주는 엄청난 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음식은 행복에도 필수적이다. 행복학자들에게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뿐인가. 음식을 남을 위로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한다. 아무리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며칠 푹 쉬고 나면 마음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아서 다시 씩씩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를 감동시킨 바베트의 그 말
하지만 내가 이 작품에서 감동받은 건 음식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바베트가 손님맞이 만찬에 가진 돈 전부를 써버린 것을 알게 된 자매가 앞으로 가난하게 살게 될 그녀를 걱정했을 때, 바베트가 대답한 말이다.
“아니에요. 전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전 위대한 예술가라니까요. 예술가들에겐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갑자기 이 영화를 떠올린 건 최근에 만난, 현역 때보다도 은퇴한 후에 더 열심히 일하는 L씨가 스스로 “예술가가 된 것 같다.”라고 한 말 때문이다. 사실 궁금했다. 현역 때도 많은 일을 해냈고, 그래서 일에 대한 욕심 같은 건 1도 없을 것 같은 L씨가 그렇게나 열심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돌아보면 월급이나 직위 같은 것들 때문에 얻은 것도 많지만 사실은 그런 것에 얽매여 있느라 하지 못한 일도 많아요. 요즘엔 돈, 직위, 직함 같은 것들과 상관없이, 나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자유롭고 행복하죠.”
내가 물었다.
“그래서 예술가가 된 것 같다고 하신 거군요?”
“물론 대단한 창작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는 점에서 예술가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일할 때 ‘난 예술가야.’라고 생각하니까 멋있는 사람 같고 좋더라고요.”

사람이 참 알 수가 없는 게,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은퇴하자마자 일에서 손을 딱 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빨리 성공, 빨리 은퇴’를 실천할 것으로 예상했던 선배나 지인들이 의외로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신기했다. 호기심도 생겼다. 70, 80이 넘어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계속 일하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 돈? 아니면 건강에 대한 자신감? 혹시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남아돌아서?
하지만 이들 중에는 돈을 벌기는커녕 자기 돈 써가면서 일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힘이 달린다는 점을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다고 대단한 보상이나 대접, 어떤 ‘자리’ 같은 것에 연연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들이 가진 특별한 그것, 예술가의 마인드
이번에 L씨의 말을 들으면서 돈이나 직위, 직함 같은 것과 상관없이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예술가’의 마인드가 있다는 걸 실감했다. 나이가 들어도 뭔가를 창조해 내려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끈질기게 추구하며, 영화 속의 바베트의 표현처럼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자기만의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다.이들은 ‘위대한 예술가니까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영화 속의 바베트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난 예술가니까 나이 같은 건 잊고 살아요.’
‘난 예술가니까 과거의 월급이나 직위, 직함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난 예술가니까 여전히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반면에 과거에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일을 그만둔 후에 뭔가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다. 뭐가 달라졌을까, 자세히 살펴보면 한창 일할 때 느껴지던 균형감, 활력, 매력 같은 게 사라졌다고나 할까. 무엇보다 대화의 범위가 좁아져서 여행이나 운동 얘기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역시 일이 답인가?’ 싶은 순간이다.
예전에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생 현역의 ‘마인드’라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예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진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말이다.

한혜경 작가, 前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책임 연구원과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나는 매일 은퇴를 꿈꾼다>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의 저서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가 겪는 다양한 이야기를 써온 작가이기도 하다 최근의 저서로는 본 사이트에 연재하고 있는 ‘나의 은퇴일기’ 내용을 토대로 한 <은퇴의 맛>, 저자가 진행하고 있는 ‘자기 역사 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기꺼이 오십, 나를 다시 배워야 할 시간>이 있다.